Description
양선희의 시에서 시인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자연으로 통한다. 자연은 그녀의 시가 뿌리내린 대지이자 시적 상상력이 솟아오르는 젖줄이다. 시인이 노래하는 자연의 기쁨은 특히 봄이라는 계절이 전해주는 생의 움터 오르는 활기와 연관돼 있다. ‘봄날에 연애’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이 시집에는 봄과 관련된 심상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집 곳곳에서 시인은 수시로 봄을 호명하고 봄이 주는 활력과 즐거움을 탐한다. 봄을 향한 사랑의 기운이 시집 전체에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 시집은 봄날에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봄날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정도다. 봄을 향한 시인의 열렬한 사랑을 들여다보기 위해 먼저 시집의 표제작인 ?봄날에 연애?를 읽어보기로 하자.
봄을 타시나 봐요
당신도 타고 싶어요
사나운 꿈을 연명장치처럼 붙들고 산 날
흔들린다
그가 내 집을 물어뜯는다
구멍을 만든다
새순을 꿈꾸는 나
끄집어낸다
그가 나의 골 깊은 겨울을
벗기고, 씻긴다
내 몸 샅샅이
색들이 살아난다
봄 탄다
― ?봄날에 연애? 전문
시인은 시의 첫 행과 둘째 행에서 일종의 펀pun 효과를 활용해 봄을 타는 마음과 당신을 타고 싶은 욕망을 재치 있게 연결시킨다. 시 속의 ‘그’는 사나운 꿈에 흔들리며 겨우 살아가던 시인을 흔들며 집에 구멍을 만들고 시인을 집으로부터 끄집어낸다. 이 과정은 “그가 나의 골 깊은 겨울을/벗기고, 씻긴다”는 구절과 더불어 성적인 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들로 표현된다. 시속에서 시인이 ‘그’라고 호명하는 존재, 그것이 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봄이 나를 벗기고 씻긴 후 내 몸 안으로 들어오자 내 몸의 색들이 샅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로써 마지막 행의 “봄 탄다”는 첫 행의 봄을 탄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인 ‘봄철에 입맛이 없고 몸이 나른하고 파리해지다’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시의 장면들은 마치 가락을 타듯 봄에 올라타서 시인의 몸이 봄과 하나 되어 흐르는 관능적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봄날에 연애?는 이처럼 봄이 가져다주는 생의 환희를 관능의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한 흥미로운 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시집에는 봄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봄은 힘이 장사지./턱을 쳐들고 가비얍게 우리 집 삐딱한 창을 열어젖힌다”(?봄?)와 “꽃나무 앞에 서서/칼바람, 우박, 폭설이 떨구지 못한 꽃눈들 세어본다./꽃 피울 힘 어림해 본다./햇살, 바람, 어둠 고요한 시간 따져본다”(?고양이와 함께 한 산책?)에서 시인은 겨우내 닫혀 있던 창을 열어젖히는 봄의 힘과 겨울을 견디어낸 꽃들의 시간을 생각하고, “꽃의 생기로/그 사람과 나/찰랑댄다//내 몸/꽃 천지”(?봄놀이?)와 “새와 나/겨울 볕드는 나무 아래/색에 홀린다.//살, 맛 난다”(?겨울정원과 나?)에서는 봄의 생기 속에서 찰랑거리고 취하는 삶의 기쁨, 삶의 맛을 노래한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토록 봄이 주는 황홀한 도취의 순간을 갈망하는가? 그것은 “통증의 빈도가 잦아진”(?안마?) 몸, “몸을 괴롭히는 생각이 많은”(?자화상?) 마음들로 잠식된 삶 속으로 빛과 볕을 들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환한 빛으로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즐겁고 싶고 신나고 싶고, 그리하여 마침내 건강해지고 싶다. 시인은 관상용 꽃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환호하다?) 자신의 몸 안으로 약처럼 밀어넣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봄꽃처럼 피어나기를 꿈꾼다. “대파 옮겨 심고/폴짝,/폴짝”(?경칩에?)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처럼 뛰어보고, “환해지자, 우리”(?봄의 수다?)라고 외치고, “새순의 호흡법 익혀야지”(?고독을 밀어붙이며?)라고 말하며, “고양이를 무릎에 앉히고/정원을 가꿀 계획을 털어놓는다./내 머리 속 정원이 우주만해”지는(?정원에서 놀다?) 시인의 마음속에는 생의 기쁨을 향한 욕망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나 양선희에게 여행, 자연과 함께 삶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아마도 시일 것이다. 자연과 여행을 꿈꾸고 봄을 노래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시의 언어들이 없다면 시인 양선희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녀는 “나를 웃게, 환호하게, 심장을 뜨겁게, 노래를 입에 달고 살도록, 다시 태어나도 시인으로 살고 싶”다고(?시가 안 써지는 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가 되는, 아니 세상 모든 것을 시로 읽을 수 있는 삶을 꿈꾼다.
시 백편 외우면 삶이 아름다워질 거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시를 읽는다.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필사하며 읽는다, 활활, 쏟아지는 활자의 활기, 활자와 활자 사이의 활기, 행간의 활기
밥상머리에서도 냇가에서도 시를 읽는다. 꼬여서 창백한 삶, 물이 오른다. 화색이 돈다.
시가 되어 있는 나무들, 시가 되어 있는 풀들, 시가 되어 있는 구름들, 시가 되어 있는 바람들, 엄지를 척 들어 올린다
― ?시를 읽는다? 부분
시 한편을 읽기 전과 읽은 후의 시간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미세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시 백편을 외우는 삶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시인은 눈으로 읽고 소리 내어 읽고 필사하며 읽는 일로 자신의 삶속에 시를 영접한다. 시를 읽는 동안 시를 이루는 활자들은 살아 있는 생명체들처럼 시인에게로 스며들어 시인의 삶을 활자들의 활기로 가득 채운다. 삶속으로 스며든 그 활기는 시인의 삶에 물이 오르게 하고 화색이 돌게 한다. 그러자 시인의 눈에는 시가 된 나무와 풀들, 구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시인이 음률을 타듯 시를 타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시인이 나무의 옹이에 올라탔던 첫 번째 시로 돌아간다. 시인의 삶을 덮친 겨울이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비틀어놓은 몸과 마음을 자연은 생명이라는 하나의 선율로 합친다. ‘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합침을 의미할 것이다. 갈라지고 상처 난 것들을 합치고 아물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이 아닌가? 나무에 새겨진 옹이는 나무가 책상으로 바뀐 후에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듣는 시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 책상에 앉아 시를 쓴다. 나무의 옹이가 보내오는 음률을 타고 앉아 그 음률을 자신의 시에 음악적으로 각인하는 법을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시인 양선희다.
Additional information
| Language | |
|---|---|
| ISBN | |
| Series | J.H Classic 73 |
| Author | |
| Publisher | |
| Publication Date | 2021-07-07 |
| Format | |
| Pages | 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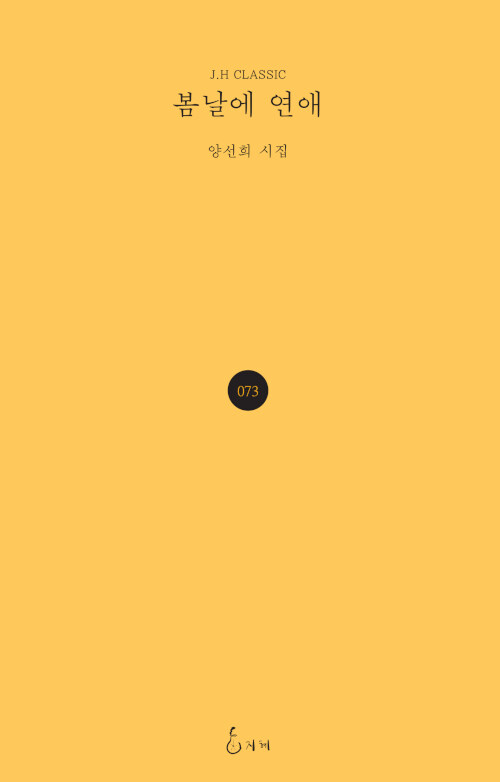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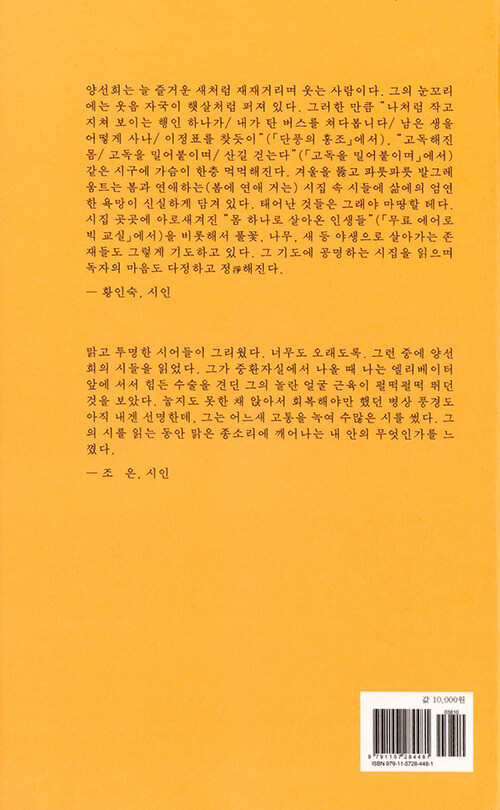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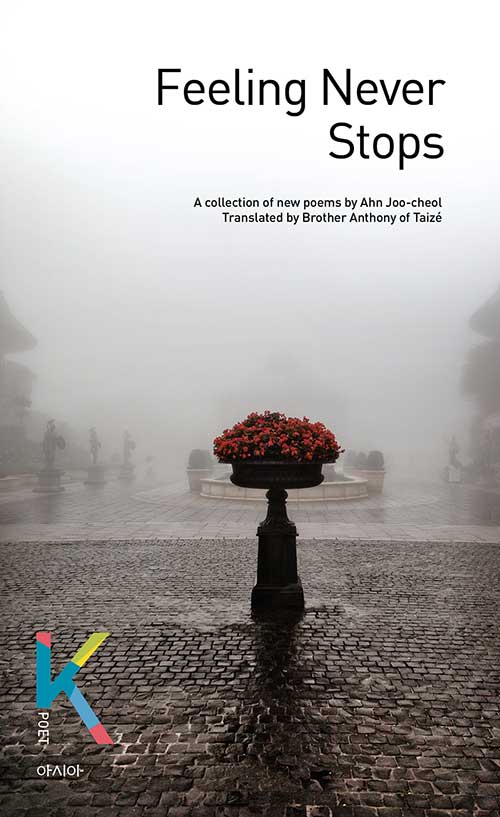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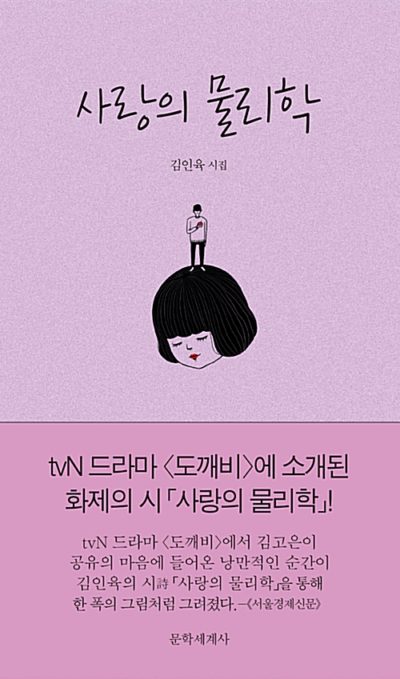
Reviews
There are no reviews yet.